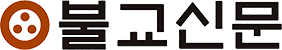지상중계 / 결사추진본부 자문위 의식개혁소위 제1차 좌담회

■ 발제1
고우스님의 ‘중도론’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인도사회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었다. 하나는 적취설(積聚說)이다. 정신과 육체가 둘로 나눠 생각해 육체가 정신을 병들게 하므로 육체를 괴롭히고 혹사해 정신을 살려내자는 고행주의다. 둘째는 전변설(轉變說)이다. 브라만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금 인도의 힌두교를 비롯해 기독교, 회교, 도교 등이 이를 바탕으로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도교는 태극과 무극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하지만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끊임없이 싸운다. 종교로 인해 인도에서 사성계급이 만들어졌고 하층민들은 불행해졌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도 고민했으나 사회제도에도 천착했다. 두 가지 설로는 국민들을 행복하고 평등하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독자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양극화 없이 잘 살수 있다는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승단을 세웠다. 그것이 동남아와 중국, 우리나라까지 전해져 2600년을 이어왔다. 이런 불교가 한국에 와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왜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부처님이 증득한 깨달음의 핵심은 ‘중도(中道)’다. 중도를 이해하면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와 사회와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당선 당시 공화.민주 양당이 서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중도적 사고다. 중도적으로 사고하면 어떤 주의든지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0%인 270조원이라고 한다. 국가예산에 맞먹는 이 돈이면 반값등록금이나 보육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처님이 중도를 깨닫고 나서 의식이 변했듯이 우리도 중도를 공부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것이 의식개혁을 하자는 이유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며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도로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
■ 발제2
무비스님의 ‘인불사상’
중도는 존재의 원리이지 불성이나 진여 등으로 이해돼선 안 된다. 중도적 원리로 깨달음과 진여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양하는 일도 중도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영명연수 선사의 ‘만선동귀중도송(萬善同歸中道頌)’은 내 생각과 맞아 떨어진다.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중도로 해야 한다. 경을 읽고 참선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등 현실생활에서 어떻게 중도적으로 해야 하나.
게송에는 대작몽중불사(大作夢中佛事), 불사할 때는 꿈속에서 하듯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스님은 크게 불사를 일으키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병을 얻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불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암에 걸려 투병 중인 스님도 봤다. 불사를 몽중불사로 생각했더라면 무슨 충격을 받았겠나. 중도적인 입장에서 불사하지 못한 탓이다. 중도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중도를 불성이나 진여라고 하거나 중도를 알아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다.
성철스님은 스스로를 ‘중도광’이라 할 만큼 부처님부터 조사 스님까지 중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봤다. 나는 ‘인불(人佛)사상’으로 일관돼 있다고 본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나는 시골에 살 때 하루에 버스 한 대 보면 잘 본 것이었다. 요즘은 그때보다 1천배 편리하고 풍요롭게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불교는 얼마나 발전했나. 시대에 알맞은 불교를 주창하고 싶다. 우리 불교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온고이지신이라 했듯이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신불교, 신대승불교, 최상승불교를 주창하고 싶다. 이것이 앞선 불교, 정법 불교, 새로운 불교며 미래지향적 불교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은 사람이 행복하고 세상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바른 열쇠다. 세상사람 모두 행복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기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것이 인불사상의 핵심이다. 여기서 구세대비(救世大悲)의 실천이 나온다. 그동안 불교는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가 되지 못했다. 인불사상을 바탕으로 구세대비의 실천으로 나가야 한다.
■ 참석대중의 말말말
“부처가 굶고 병들었는데 그냥 두고 볼 일인가”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쇄신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다. 종단이 의식변화를 이룰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면 받들어 종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우리 의식이 변하는 만큼 종단도 변한다. 의식개혁을 갈망하고 소위를 설치해 고우스님이 중도로 개혁하자는 강한 원력의 추진에 종단은 희망을 걸고 있다.
도법스님(결사추진본부장) 의식개혁 없는 쇄신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의식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불교관과 실천론을 잘 정리하는 것은 한국불교 내일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지안스님(고시위원장) 젊은이들이 습득하는 정보가 우리보다 많다. 이런 세상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하려면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한다. 학인들은 존경심을 가질만한 스님이 없다고 한다. 큰 스님들의 책임이다. 그것을 깨우쳐주려면 소통해야 한다. 한국불교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젊은 스님들이 기성세대에 느끼는 벽을 깨야 한다.
무비스님(전 교육원장)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교육시킬 때 ‘같이 일하고 같이 먹는 것’이라고 해서 다 알아들었다. 개화기 당시 사람들에게 ‘개화’를 ‘평등’이란 말 한마디로 관철시켰다. ‘사람은 평등하다’는 초점으로 교육시켰다. 이 시대에 와서 불교를 새롭게 개혁해보자 하는 뜻이 있는데, 기존의 관념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설득력 있는 하나의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고우스님(원로의원) 밀가루로 빵도 과자도 만든다. 밀가루라는 중도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먼저 밀가루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만들면 더욱 효과적이다. 중도를 이해하니 내가 위대하다는 자존의식이 생겼다. 중도에 대한 인식부터 하자. 의식개혁은 깨달음이 아니라 인식하자는 것이다. 인식만 해도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다.
무비스님 의식개혁이 목표라 생각하면 중도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할 것 없다. 실천지침과 행동지침이 중요하다. 스승과 제자 같이 절하기, 스님과 신도가 함께 절하기 운동을 하면 중도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같이 절하는 이유는 평등하니까. 이처럼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세상을 평등하고 평화롭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 중도를 실천해 모든 존재가 중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맞절부터 해야 한다. 실천 못하면 공염불일 뿐이다. 그것 없이 의식개혁은 안 된다.
지안스님 현재는 개인주의가 발전한 시대다. 부모말도 안 듣는 시대다. 그 사람들이 출가해 신진 스님이 된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인정해야 한다. 배제시키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인식아래 의식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그들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
고우스님 존재 원리는 본래 부처인데, 이를 망각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런 잘못된 사고를 중도로 환원시키고 수행하면서 깨달음으로 가자는 것이다. 자기 구원과 사회 공헌이 깨달음의 목적이다. 인종과 이데올로기, 민족 등 갈등에서 가장 심한 것이 종교갈등이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해소할 수 있다.
무비스님 사회를 변혁하는 사람들은 인재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도 스님들은 시시하다. 질이 낮은 단체를 교육시킨다고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승가에는 인재가 없다.
지안스님 새로운 승가상 정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불교에는 견성인이 아닌 지성인이 필요하다. 인재가 없다는 것은 지성인이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시대가 달라졌다. 스님들도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 대승불교로 와서 해탈지상주의에서 구세대비주의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해탈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비스님 지금은 깨달음이 없는 시대다. 구세대비주의로 나가는 것이 답이다.
고우스님 중도를 교육하자는 것과 실천을 통해 중도로 가자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행위를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교육부터 하자는 것이다.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구세대비고 구세대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고우스님 대체적으로 종단에서 문제되는 그룹은 주지다.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잘못하면 악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다. 주지들을 상대로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제도 중에 가장 비불교적인 것이 선거법이다. 가급적 대중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비리가 더 많다면 선거는 하되 등록만 하고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재정투명화다. 종단 한해 예산이 300억원 정도인데 재정투명화를 하면 4배는 불어날 것이다. 1천억원 예산이 편성되면 스님 사이에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승려복지도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을 고치고 않고 불교는 주저앉는다. 이것의 전초전이 의식개혁이다. 의식개혁은 한국불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의식개혁을 위해 계몽하자는 것이다.
도법스님 불교 언어는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다. 초기불교는 사성제를 실천해 해탈 열반하자고 했고, 중국 선종은 마음이 불교라고 했다. 불교가 각 시대에 따라 요구에 따라 처방해왔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
무비스님 사람이 부처라고 할 때 그 태도는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구세대비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행동지침이다. 부처가 굶고 병들었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받들자는 실천행동으로 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고우스님 굶는 사람에게 물질만이 아닌 법으로도 보시해야 한다. 불교가 아니어도 물질보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불교는 법보시도 해야 한다.
무비스님 근본바탕은 중도로 깔고 중도로 보니 사람이 곧 부처이므로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받들자는, 세상에 보탬이 되는 불교가 되기 위한 답을 하자. 세상에 봉사하는 단체나 사람은 많으나 중도를 바탕으로 하는 인불사상을 철학으로 삼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은 불교밖에 없다. 음식을 주더라도 불법을 얹어서 주자는 것이다.
[불교신문 2880호/ 1월16일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